2019. 5. 26. 19:28ㆍ역사


톈진조약 [ 天津條約(천진조약) ]
중국 톈진에서 청국과 여러 외국 간에 맺은 조약의 총칭.
최초의 톈진조약은 애로호사건에 관련하여 1858년 6월,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 각 4개국과 청국이 맺은 4개의 조약이다. 이 4개조약은 모두가 편무적 최혜국조관(片務的最惠國條款)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대(對)영국조약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외교사절의 베이징[北京] 상주,
② 내지(內地)여행과 양쯔강[揚子江] 통상의 승인,
③ 새로운 무역규칙과 관세율 협정(이로써 아편무역이 합법화되었다),
④ 개항장(開港場)의 증가,
⑤ 그리스도교의 공인 등이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대하여 합계 600만 냥(兩)의 배상금과 그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광둥성성[廣東省城]의 보장점령 등이 있다. 영국·프랑스와의 조약은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 후, 베이징 협정과 동시에 비준교환되었다.
이 밖에 주요 톈진조약으로서 1871년 청·일 양국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영사 재판권을 상호인정하고 최혜국조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통상조약, 조선의 갑신정변에 관련하여 조선으로부터의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을 약속한 1885년의 톈진협정(청·일), 청·프전쟁에 관련하여 1885년 맺은 톈진조약(청·프, 청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인정하였음) 등이 있다. 그리고 1860년대 독일·포르투갈·덴마크·네덜란드·에스파냐, 1870년대 페루·브라질과 맺은 톈진조약이 있다.
톈진협정(청·일)
天津條約 1885년 4월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청과 일본의 조약.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중이었고 특히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고 있었다.
1884년 청프전쟁이 발발하여 조선에 주둔중인 청군 일부가 철수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여긴 김옥균, 박영효등의 급진 개화파 세력이 일본 공사관 다케조에 신이치로의 재정과 군사 지원 약속을 받고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급진 개화파세력은 당시 친청세력인 민씨 정권 요인(민영목,민태호 등)을 살해하고, 왕과 왕비를 볼모로 삼아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갑신정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명성황후 민씨의 모략으로 청군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의 소극적인 대처로 결국 청군이 진압하게 된다.
이후 정변을 주도한 급진 개화파들은 죽거나 해외로 망명하게 되고 개화당 정부 수립 3일만에 갑신정변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정변을 진압한 청군의 내정간섭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청과 일본이 1885년 4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톈진 조약이다.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조약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청과 일본 양군 모두 조선에서 철수한다.
2.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별 내용없는 조약이지만 조선의 종주권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어 청의 종주권이 인정되는 셈이었으며 위안스카이등 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조선은 한러밀약등의 타개책을 구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파병 조항은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농민군이 차례로 조정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니, 조정이 청군에게 진압요청을 하게 되어 청군이 조선땅을 밟게 된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일본군 역시 톈진조약을 근거로 즉각 발효 직후 중에 도중 파기하며 조선에 상륙하게 된다.
사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기 위해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군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아산만에 상륙하였지만 일본군은 아산만이 아닌 인천에 상륙 후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인천에 상륙한 5월 6일로부터 이틀뒤인 5월 8일. 조정은 '농민군을 진압하였으니 외국군은 철수하라' 는 명분을 위해 농민군과의 전주 화약을 체결했지만 때는 늦어 조선을 노리던 청과 일본 양국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청은 패배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더이상 조선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동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할 줄 알았던 일본은 삼국간섭에 의해 한발 물러서게 되는데, 후일 앙심을 품은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바로 러일전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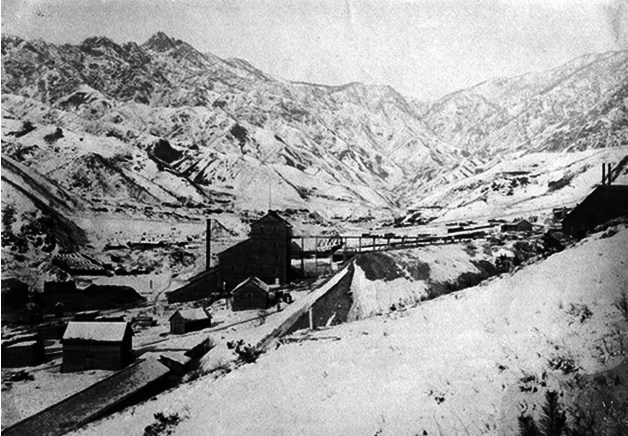


제물포조약 [ 濟物浦條約 ]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일본측의 피해보상문제 등을 다룬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약.
강화도조약으로 개국한(1876) 조선은 개국이후 개국에 따른 정치적 진통을 겪게 된다. 조선 정부는 개국에 따라 해외 선진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여 근대화해야 한다는 개화파와 해외 문물은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해치는 것이라하여 양이(洋夷)문화로 비하하고 개화를 반대하는 수구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항 이후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새롭게 창설된 것이 ‘별기군’(別技軍)이었다. 별기군은 일본군 교관을 초빙하여 양반자제를 선발하여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는 새로운 군대조직이었다. 별기군 군인들은 우대를 하고, 구식 군인들은 홀대를 하게 되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난동을 일으켜 고관을 살해하는 등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 공관(公館)이 불에 타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堀本禮造) 등 다수가 피해를 당하였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위안스카이(袁世凱)가 군사 3,000여명을 데리고 와 난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해갔다. 이러한 일로 일본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차, 정치적으로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맞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피해와 정치적 후퇴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과 강력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제물포조약이다(1882).
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은 전권공사로 하나부사(花房義質)을 조선에 파견하고, 이노우에(井上馨)을 조선에 가까운 시모노세키(下關)에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뒤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담판에 대한 훈령과 지시를 받아, 군사를 대동하고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7개조 항의 요구를 하였다. 이를 접수한 조선 정부는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하고,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일본과 회담하도록 파견하였다. 일본은 제물포항에 정박한 자국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일본군의 삼엄한 포위 하에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 결과 일본측의 일방적인 강력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조선측의 요구는 강화도조약 당시에 개방하기로 한 대구와 함흥의 개시(開市)를 삭제하고, 공사관 호위병 수를 수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 8. 30).
제물포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지금으로부터 20일을 기하여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수괴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 릴 것.
제2항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지낼 것.
제3항 조선국은 5만원을 지불하여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지급할 것.
제4항 흉도의 폭거로 인하여 일본국이 받은 손해 그리고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비 중에서 50만원을 조선이 부담하되, 매년 10만원씩 5년에 걸쳐 완납 청산할 것.
제5항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명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국이 책임을 지고, 만약 조선국의 병·민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후에 일본 공사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병을 해도 무방함.
제6항 조선국은 일본에 대관(大官)을 특파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일본측은 상기 6개항으로 임오군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일본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내에서의 상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금후 확장하여 사방 각 50리(조선 리법 에 따름)로 정하고, 2년 후를 기하여 다시 각 100리로 할 것.(항구의 크기를 확장·확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둘째, 일본국 공사·영사와 그 수행원 및 그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을 허용하며, 예조(禮曺) 에서 여행지를 지정하여 증서를 급여하되, 지방관은 그것을 대조하고 호송한다.(조선의 지방관에게 일본 외교관의 호송 임무까지 부담지운 것)
조약체결 결과, 군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원 가운데 15만원을 선 지불하였으며,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金晩植)을 일본에 사죄사로 파견하였다.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1개 대대 병력을 한성에 파견하게 되었다.


한성조약 [ 漢城條約 ]
1884년(고종 21)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뒤처리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조약.
개항 이후 조선 내에서는 정치적 격변이 자주 일어났다.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발할 때면 청나라와 일본이 관련되고, 두 나라의 대립이 이루어졌다. 임오군란 때에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대원군을 납치해가는 등 조선 내에서 세력을 키웠다. 일본은 반대로 공관(公館)이 불타고 인명피해까지 나는 등 피해를 당했다.
갑신정변은 국내의 정치적 사건이었으나, 당시에는 일본이 혁명 세력과 연결하여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궁중에 있던 일본군이 청군에 쫓겨나는가 하면, 일본 공사관은 민중의 습격을 받아 불타고 일본 거류민이 피살되는 등 일본측이 피해를 당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위의 두 사건에서 청·일 양국이 연루되면서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조선에서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자 일본은 강경한 자세로 이에 대응하여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월남에서 프랑스와 충돌하고(청-프랑스 전쟁 1884 ~ 1885) 있던 터라, 일본과는 평화롭게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은 군사를 이용하여 조선과 조약 체결을 강행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을 피해 일본으로 귀국한 다케조에[竹添進一郞] 공사를 조선으로 보내 예비교섭을 주선하였다. 그는 사변시말서(事變始末書)를 제출하여, 정변 당시 일본측이 행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 공사가 난도들(정변 주동자)을 비호하였고 그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킨 장본인이므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여 그의 협상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굴하지 않고 무력으로 나왔다. 전권대신의 명을 받은 외무경 이노우에[井上馨]는 서기관 곤도[近藤眞鋤],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와 함께 육군중장 다카시마[高島鞆之助], 해군소장 가바야마(樺山資紀)가 지휘하는 2개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에 들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좌의정 김홍집(金弘集)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협상에 들어갔다(1884. 11. 22).
일본측은 여러 가지 요구를 강하게 하였으나, 공사관 건축비를 반으로 삭감하고, 공사관 호위병 1,000명을 주둔시키겠다는 요구를 제외시키도록 하는 데 합의하고 대체로 일본측 요구대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일본측은 한국측의 요구인 김옥균(金玉均)의 반환을 인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다케조에 공사 등을 일본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일본측도 갑신정변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나, 무력시위를 통해 협상을 강행한 것이다. 협상 결과는 협상 개시 3일만에 ‘한성조약(漢城條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1884. 11. 24, 양력 1885.1.9).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謝意)를 표명한다.
제2 일본국 조해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원을 지불한다.
제3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사문 나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제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房屋)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건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제5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관 부지를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壬午續約 = 제물포조약) 제5 관에 따라 시행한다.
- 별단(別單) -
1. 약관 제2·4조의 금액은 일본화폐로 계산할 것이며, 3개월을 기하여 인천에서 완불한다.
2. 제3조의 흉도를 처단함은 입약 이후 20일을 기한으로 한다.
한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단숨에 두 가지를 해결하였다. 첫째는 조선의 정변 과정에서 일본측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았다. 가해자도 처벌토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둘째는 조선에서 실추된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였다. 그 동안 청나라에 밀려 조선정부에 위세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청이 국제관계에서 곤경에 빠진 시기를 이용하여, 조선 정부에 강압할 수 있는 위세를 회복한 것이다.


전주 화약 [ 全州和約 ]
1894년 동학농민운동 중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고 정부와 맺은 화약
동학농민운동 중 민씨 정권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와 일본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전주성 점령 후 서울로 진격할 계획이었던 농민군 지도부는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주둔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와 화약을 맺기로 하였다. 화약의 조건으로 폐정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894년 5월 7일 전주화약이 맺어졌다. 폐정개혁안에는 신분제의 폐지와 삼정의 개혁 등이 들어 있었는데 토지 개혁의 요구는 소유권의 균분에서 경작권의 균분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전주화약이 맺어진 후 해산한 농민들은 각 고을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안을 토대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불이행하였고, 일제의 침입과 함께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농민들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고 이로 인해 전주화약은 파기되었다. 이후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와 태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지도자인 전봉준이 1894년 12월 2일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좌절되었다.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 "SBS 녹두꽃" (0) | 2019.05.12 |
|---|---|
| 조선시대 명문 명벌 (0) | 2019.05.09 |
| 조선왕조 21대~27대 (0) | 2019.05.09 |
| 조선왕조 11대~20대 (0) | 2019.05.09 |
| 조선왕조 1대~10대 (0) | 2019.05.08 |